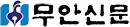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보리를 퍼다 주면 참외를 준다는 말로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기고 살아 본 사람들이나 알고 있을 법한 말이다. 즉, 보리쌀도 아닌 보리이삭(모가지)을 주어다 낱알을 털어 그것을 가지고 참외나 수박밭을 기웃 거리면서 바꿔먹던 시절의 얘기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인 셈이다.
돈만 있으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간혹 돈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일과 부딪치고는 한다.
“위험 수목을 베어 드립니다!” 라고 소문을 내 놓았더니 여기저기서 나무를 베어 달라는 전화가 빗발친다. 주로 농촌마을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고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다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따라 현장에 나가보면 위험천만한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레 겁을 먹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가는 나무의 기세(氣勢)에 눌린 탓일 것이다.
사실 언제 부터인가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수호신(守護神)이나 버팀목처럼 자리를 잡고 있던 수목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바람이 불고 비라도 올라치면 언제 지붕을 덮칠지 모르기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에게는 앓던 이(齒)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섣불리 제거를 하려고 해도 수십만 원을 들여야 하는 장비 임차료도 문제지만, 막상 톱질하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비슷한 집들이 같은 마을에 서너 집만 되어도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을 끓인다는 것이다.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나부터 우리부터 가다듬고 군민들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제안(提案)을 해서 채택된 것이 ‘위험(危險)수목 정비사업’이다.
이렇듯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을 찾아가서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마을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지만 쉽지마는 않다.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기에 베에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베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장비 들 동원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해야 하고 또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하기에 신경이 곤두 설 수밖에 없다.
다소나마 이런 저런 것들을 덜기위해 몇 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정비대상 수목을 받도록 했었다. 그것은 아파트나 상가·관공서 등 수목의 관리주체가 존재하거나 낙엽이나 낙과 등 사유지내 단순불편 민원 수목과 임야(산림)내 수목 및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불법시설 내 수목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막 무가내다. 심지어 도로변에 조성해 놓은 가로수까지도 농작물에 장애가 되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베어달리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수목의 수액이 이동하기 전까지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일선 읍면에서 정비대상 수목을 걸러내지 못한 탓에 그런 일까지 처리하다 보니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정작 정비해야 할 수목, 즉 폭우가 쏟아지거나 강풍이라도 불게 되면 금방이라도 넘어져서 가옥을 덮칠 위험수목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늦어지는 것이다. 젠장 장비 진입이라도 수월하면 빠를 텐데 아직도 마을안길은 고샅길이 대부분이니 말이다.
육남매를 낳아 키워 출가시키고 지금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에 지붕을 드리운 팔십 년은 족히 돼 보이는 팽나무 한 그루를 깔끔하게 베어 드렸더니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며 돈을 주고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군(청)에서 해주니 너무도 고맙단다.
그래, 정작 고맙다는 얘기는 30미터가 넘게 뻗어나간 카고 크레인 위에 올라서 톱질을 하는 작업반원들인데! 그러면서 나는 또 ‘위험수목 베어 드릴 테니, 제발 나무밑동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라는 당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