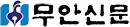박금남(무안신문 발행인)
[무안신문]

코로나19로 요즘 사람들이 난리다. 온통 코로나 이야기뿐이다.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도 흠이 되지 않는다. 악수를 꺼리다 보니 먼저 손을 내밀다가 계면쩍은 적도 많다. 정기 모임도 취소되면서 퇴근해 집에 가면 딱히 할 일도 없다.
올해는 눈도 안 오고, 큰 추위도 없어 겨울이 사라졌다고 했다. 어떤 이는 지구가 죽어간다고 했다. 어른들 입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같은 전문용어가 쉽게 튀어나왔다.
그럴 만도 했다. 올겨울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다는 기상청의 전언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예년보다 빨리 앞 다퉈 피어난 꽃들을 게재하며 봄의 전령사가 왔다고 부산을 떨었었다.
겨울은 설날이 지나자 햇볕은 봄 햇살이었다. 버들강아지와 참나무 잎눈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들녘 양지녘에는 개불알꽃, 광대나물, 냉이꽃 등 풀꽃이 지천에 피어났다. 새들 울음소리도 맑고 투명하게 변했다. 이렇게 첫눈을 못 보고 겨울이 가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겨울은 남아 있었다. 지난 2월7일 예년보다는 한두 달 늦었지만 우리 지역에도 첫눈이 내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언제 겨울을 원망했냐는 듯했다.
첫눈은 기다림의 깊이만큼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겨울의 심술궂은 뒤끝 작렬이라면 틀린 말일까. 겨울이 만만하게 봄에게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자연의 경고였다. 태풍 바람을 동반하여 내린 눈보라가 지나간 뒤에는 빗자루를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적설량이었다. 그래서 올겨울 첫눈은 추운 눈보라만 기억됐다.
첫눈을 기다리는 데는 겨울의 삭막함 때문이고 추억과 그리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첫눈은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무언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망을 품게 한다. 그래서 눈은 그냥 설레는, 우리들의 늙지 않은 따뜻한 마음이다. 곧 기다림은 이 세상 만물의 공통된 습성 가운데 하나란 생각이다.
경칩도 지나고 춘분(20일)을 앞둔 3월 중순이다. 나무들도 이제는 제법 물이 올랐다. 밤과 낮이 음양이 번갈아 변하듯, 그렇게 철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겨울에 단련된 봄이 오면 사람도 또 한 번 철이 든다.
요즘 천천히 걷다보면 주변의 살아 있는 작은 것도 보인다. 매화나무는 벌써 꽃을 피우고 지고 있다. 올 겨울 매화나무 때문에 부질없이 부지런을 피웠던 내 조급증에 반성도 해 본다. 집안에 둔 매화분재에 대해 꽃을 조금 빨리 피우려는 욕심으로 햇볕이 좋으면 밖에 내놓고 밤이면 방안에 가둬 온기를 느끼도록 부지런을 떨었다. 덕택에 들녘 매화보다는 며칠 일찍 꽃을 피웠지만 기쁨도 잠시, 생기가 덜하고 꽃잎이 빨리도 떨어졌다. 자연 이치를 거슬리는 욕심이 괜한 고생만 했다. 만물엔 제각기 나름의 속도와 리듬이 있는 법인데 말이다.
그리고 어느 사이 진달래와 산수유가 피었다. 승달산 등산로 주변에는 산자고 군락지도 있다. 휴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지도 폐장하다보니 마땅히 갈 곳도 없다. 그래서 잔디보다 일찍 깨어 봄기운을 끌어당겨 세상 구경을 나온 마당 잡초를 뽑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합지졸 심어둔 정원에는 지난해 초겨울까지 은은한 향기를 나눠주다 겨울 동안 땅속 기운과 접촉하고 있었던 국화가 벌써 새싹이 돋아 솎아준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 늦게 싹을 틔우는 화단 속 감나무와 대추나무도 머지않아 가지마다 새싹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사철(오행)의 흐름과 함께 봄이 와 있다. 지난 주말에도 인적 드문 양지쪽에 자리 잡고 앉아 시간을 낚으며 겨울과 봄 사이 환절기를 느껴보았다.
삼라만상에는 다만 조금 빠르고 늦음뿐이다. 봄이 왔다고 부산을 떠는 겨울의 끝자락 어디엔가는 아직도 꽃샘추위가 음지에 숨어 웅그리고 있을 것이다. 봄에 피어나는 연약한 새싹들에게 시련을 주어 여름의 폭풍과 폭우를 견뎌 내도록 단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따뜻하면 물러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올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조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