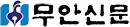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무안신문] “왜, 유독 횟집 앞 가로수만 죽는 것일까?” 시가지를 지나다 종종 목격하게 되는 광경 중에 하나가 횟집 앞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거나 벌써 고사(枯死)되어 베어져 나간 흔적들이다.
왜일까? 말하기 부끄럽지만 십중팔구 이런 경우 수조(水槽) 속에 담겨 있던 물을 가게 앞 길바닥으로 쏟았거나 외부에서 운반해 온 바닷물을 수족관에 담는 과정에서 일부가 가로수 쪽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봤냐?’ 라며 쌍심지를 켜고 대들지도 모른다. 가게의 주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로수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전남 서남권역의 주민들이 독자인 모 권역지에 인근 시군에서 가로수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기사가 유독 눈에 뜨인다. 아무래도 예전에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골머리를 아파 봤기 때문일 것이다.
비단 횟집 앞 가로수들만 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 거리의 가로수는 대부분이 그렇다. 느타리나 표고의 버섯 목을 만들듯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여해 놓은 경우도 있고,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퍼부어 놓은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뿌리 부근을 빙 둘러서 껍질을 벗겨 놓았거나 보란 듯이 수관(樹冠)부를 몽땅 잘라내어 몽둥이만 남겨 놓은 몰상식한 경우도 있다.
왜! 이럴까? 벌써 몇 해 전 이맘 때 일이다. 시간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읍내 어디어디에 사는데, 모 카센터 앞 느티나무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는 것이다.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을 신고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며 한사코 뒤로 빼는 것을 어르고 달래서 신분(?)을 알아냈고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다 들을 수 있었다. 카센터 건물을 지을 때 일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접수된 민원이기에 현지에 출장하여 가로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분명 주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잎이 쌕쌕한 데 유독 그 가게 앞에 서 있는 나무만 수세도 형편없고 조기 낙엽으로 이파리도 몇 개 달려 있지 않은 것이다.
성급하고 순진한 마음에서 가로수가 서 있는 곳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의뢰했지만 수수료만 날렸었다. 행여 나무에 위해를 줄 요량으로 제초제나 염분 등을 사용했다면 성분이 남아 있을까 해서였는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았다.
‘심증(心證)은 가는데 물증(物證)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즉. 개연성(蓋然性)은 충분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일컬어 범죄학에서 쓰는 말이다. 그렇다고 데려다가 범죄인을 다루듯 다그칠 수도 없는 일이고, 나무마다 CCTV를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의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는 길 밖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나이를 먹게 되면 중정(머리)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7~80은 더 되어 보이는 노인네가 대로변에 식재된 은행나무 이파리가 이녁 집 마당으로 떨어진다며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전화가 걸려 왔더라는 것이다. 대책이 안 서는 노인네다. 가로수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마냥 ‘예 예’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그렇고 한 자리에서만 삼 년이 넘었으니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할까? 그게 수순일 것 같았는데, 그 뒤로 일 년을 더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오늘 아침 모 시군의 가로수 훼손 행위 집중단속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그 무렵에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허공 속에 날려 보내며 몇 그루 남아 있지 않은 읍내 시가지의 은행나무들이 다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