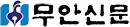발행인 박금남

타인에게 소개할 때나 소개될 때, 서류에 이름을 기입할 때 등 타인이 내 이름을 부르기보다 스스로 이름자를 확인하곤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끼여 살면서부터는 직장에서 부여해준 직책에 접두사로 붙는 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직책은 조직사회에서 획득한 만큼 이름으로 굳어지고, 퇴직 후에도 이름을 대신해 살아간다.
그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오면서도 머릿속에만 가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가을이 되면서 문득문득 떠오른다. 보고 싶은 친구도 많아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 이름도 떠오른다. 하지만 너무 오랜 동안 연락 없이 지낸 탓에 친구들의 이름자를 다시 덮어 버린다. 결국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함에 대한 그리움(이름)이 더 깊이 간직되는 모양이다.
가을에는 머리 속에서 잠자고 있는 추억과 그리움이 너무 많이 꿈틀거림을 느낀다. 때문에 가을에는 여행을 떠나도 외롭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함께하지 못함 때문이다. 가을 황혼이 유난히 붉고 가을밤 달의 투명함에서도 함께하지 못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잠 못 이루는 밤 내리는 가을비는 우울함이 보태지고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도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이다.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구성원으로 살아 갈 뿐 혼자되어 감에 외롭다. 가족도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 머무는 구성원 일뿐 현대인들에게는 가정이 없다. 식사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잠자는 시간도 각자 다르다. 주고받는 대화라곤 자신에게 필요함이 요구될 때 뿐, 더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가족이 곁에 있어도 귀함이 없다. 금은 보석을 가져도 그 순간 기쁘고, 시간이 지나면 귀함의 가치를 잊어버리듯 말이다.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은 떠난 뒤에야 잊고 살아 온 가치에 대해 호들갑 떨며 후회하곤 한다.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에 향수마저 사라진 것도 외롭움을 보탠다. 편리함이라는 허울로 산천은 찢기고 발겨져 어린시절 고향의 흔적이 사라졌다. 마을 어르신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자녀를 따라 도시로 강제이주도 많다. 따라서 시골에 가면 칭찬해 주는 어르신이 없다. 어릴 때 추억을 함께 쌓았던 친구들도 명절에 찾을 리가 만무하다. 따뜻함이 없는 고향이 된지 오래다.
올 여름 역대 최고라는 폭염을 견딜 때는 무작정 가을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무더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단순함에서다. 그리고 가을이 왔고, 누렇게 익은 벼논은 벌써 빈 논으로 황량함을 안겨 주고 있다. 축제장의 전구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빛을 빚어가던 과일들도 모습을 감추고 있다. 준비 없이 무작정 맞은 가을에서 얻은 것 없이 가을을 보내는 요즘이다.
그리고 한 가지 가을에는 사람들의 꿈이 봄날에 비해 소박해 진다는 점을 느낀다. 남은 한 해를 무탈하게 넘기고, 춥지 않고 외롭지 않는 겨울나기가 그것이다. 자식들을 분가 시킨 부모들은 건강하고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삶이 희망이다. 어르신들은 누군가 함께 있어 사리사욕에 넘치는 이야기보다 어른답지 않는 시더분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루에 몇 번 웃을 수 있다면 최고다.
그런데 주변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없음을 알기에 가을에는 외로움이 커진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때 외로움은 풍족함에서 나타나는 사치인지 모르겠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젊고 늙음을 떠나 모두가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반복적인 일이 많아지고 좋은 일보다는 화가 치미는 일이 많아진다. 이럴 땐 나를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할 듯 싶다. 그리고 매일 바삐 살아야 덜 외로울 듯 싶다. 누군가는 그랬다. 외로움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