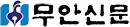박석원(몽탄출신, 전 무안교육청 교육장)

향수鄕愁 때문일까. 이 때에 피아노 앞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홍난파의 ‘고향의 봄’을 연주하고 되고 윤용하의 ‘보리밭’을 노래하게 된다. 학교에서 합창단을 맡았을 때 이 두 노래를 지도했던 기억이 봄 아지랑이처럼 아련하다. 어찌 보면 내가 살던 고향 봄날의 정경을 이 두 노래처럼 감성적으로 잘 표현한 곡도 없지 싶다.
나의 고향집은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앞 들판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바로 뒤편은 산이었다. 새색시 분홍치마 같은 진달래꽃이 온 산을 물들일 때면 꽃마중을 하기 위해 뒷산에 오르곤 했었다. 메마른 토양에 키 작은 소나무가 대부분인 산등성이에는 가녀린 줄기에 달린 연분홍 진달래꽃이 지천으로 피어났다.
솔숲 사이사이에 피어난 붉은 꽃이 푸른 솔과 조화를 이루어 산골은 그야말로 그림같이 아름다운 꽃 세상이 되었다.
산과 들은 봄볕으로 포근하고 마을 건너 양지바른 묘소의 황금빛 잔디는 쏟아지는 봄햇살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아마 거기에는 키 작은 할미꽃이 잔디를 헤집고 올라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자줏빛 꽃잎을 내밀고 있었으리라. 어른들은 일하러 나가고 마을은 봄볕에 졸고 있는데 먼 산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만이 산골의 적막을 더욱 아늑한 고요에 잠기게 하였다. 당시 내가 살던 시골의 꽃나무는 과일나무를 제외하면 오로지 진달래만이 자연적으로 꽃을 피워내는 나무였다. 그래서 고향의 봄꽃을 생각하면 진달래가 먼저 떠오른다. 진달래꽃을 꺾어 빈병에 꽂아 마루 한 편에 놓아두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남도에서 살다가 중부지방으로 사는 곳을 옮긴지 4년째이다. 이 곳의 겨울풍경은 회색빛이라서 매우 낯설었다. 남부지방은 겨울에도 산과 들에 푸른 기운이 감돌고 들녘은 이모작으로 뿌린 보리가 파랗게 자란다. 봄이 되면 마을 앞 들판은 녹색 융단을 펼쳐 놓은 듯 싱그러움 가득한 보리밭이 된다. 뒷산에서 내려다보는 들판은 키 자란 보리가 봄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바람을 볼 수 있을까. 나는 그 물결치는 들판의 보리밭에서 남녘을 스쳐온 따스한 바람을 보았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보리의 알찬 꿈을 키워내고 있는 부드러운 손길의 봄바람을.
이 때쯤이면 먹을 것이 부족애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려운 시기가 된다. 하지만 어린 우리들이야 그런 걱정은 몰랐다. 보리 끄스름을 해먹던 기억이 한 자락의 추억으로 남아 있을 뿐. 신작로 옆 비탈에는 너른 바위가 있었다. 그 곳은 하굣길의 놀이터였는데 보리 끄스름은 주로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 소나무 삭정이를 꺾어다가 불을 지피고 그 위에 풋보리 이삭을 얹어 구워 먹는 것이다. 군것질 거리가 없던 시절에 먹었던 맛있는 간식이었다.
금년 봄에는 변함없이 고향의 뒷산에는 진달래꽃이 피고 동네 앞 들판에는 청보리가 푸른 물결을 이룰 것이다. 세상에는 변해야 좋은 것도 있지만 이처럼 변치 않아서 좋은 것도 있다. 도시의 발전으로 잃어버린 고향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글을 읽은 때가 있다. 그들은 나고 자란 어릴 적을 추억하며 고향을 찾지만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쓸쓸히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의 고향은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시골이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아직도 고향에 남아있는 산山 한 자락의 땅값이 개발바람이 불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해도 나는 싫다. 언제까지나 고향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이 고향에 대한 나만의 마음일까.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말이다. 한낱 짐승도 이럴 진데 사람의 마음이야 어떻겠는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나에게 그래서 고향은 더욱 애틋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고향쪽 하늘을 바라본다. 오늘따라 하늘이 맑다. 저 하늘 끝의 고향도 그럴까.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고향의 봄’을 연주하며 옛 생각에 젖는다.
나의 살던 고향은 / 꽃 피는 산골 ······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 옹기종기 모여 구슬치기, 자치기를 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곳 텃밭에는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복숭아꽃은 벚꽃이나 산수유꽃과는 달리 이목구비가 뚜렷한 준수한 청년의 얼굴 같아서 꼭 가까이 다가가서 꽃 속을 들여다보곤 했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봄을 맞고 있을까. 그 친구들이 그립다.
피아노 연주는 ‘보리밭’으로 이어진다.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 뉘 부르는 소리 있어 ······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던 보리밭 사잇길. ‘필릴리 필릴리’ 단조롭지만 정겹던 보리피리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산자락에서 재잘거리던 산새 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 ‘저녁놀 빈 하늘만’처럼 뉘엿뉘엿 해가 서산으로 질 때쯤이면 쪽물 번지 옷감마냥 파랗고 곱던 빈 하늘만 저녁노을로 붉게 붉게 물들었었다.
피아노의 울림은 끝이 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고향의 봄 언저리를 맴 돌고 있다. 금년에는 꼭 진달래와 청보리를 만나러 고향 나늘이를 해야 할까보다. 이 봄이 무르익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