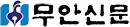그런데 갈수록 설날 의미는 희미해지고 있다. 집안끼리의 잠시 만남 일 뿐이다. 경기침체가 깊어져 어렵게들 살면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변했다. 또 그것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에 있어서 보통 삶이 됐다. 모든 것이 편리 추구 쪽으로 생활패턴이 변한 사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도 걸어야만 될만큼 바쁨이 체질화된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문, 정체성 따위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 한다. 그렇다고 찾아 온 고향도 많이 변해 정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린 시절 보았던 부모님들은 세월 속에서 독거세대로 남아 절간 암자를 지키듯 이집저집 한산하기만 한 것도 생기있는 고향 느낌이 떨어진다. 그래서 잠시 들썩이던 고향도 귀성객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면 고향은 또다시 빈자리로 남아 긴 여운과 쓸쓸함만 한 동안 더해지곤 한다.
그러나 설은 우리 조상들이 혈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전통의식 및 놀이를 통해 민족의 정서를 담아 이어 온 명절임에 틀림없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생활하는 나라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으로 하고, 구정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해가 바뀌는 날로 정하고 시작한다. 영농생활을 위주로 하는 동남아 국가는 음력 절기를 맞춰 농사를 짓다보니 주로 음력설을 쇠는 경우가 많다. 설날은 나라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설날에 떡국을, 중국은 만두, 양력설을 쇠는 일본은 찹쌀모찌(떡)를 만들어 먹는다.
군사정부 시절에 신정 연휴를 늘리고 설을 쇠도록 한적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구정을 지냈다. 결국 정부는 민족의 정서에 반하는 ‘신정’ 용어를 없애고 구정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로 법제화 하여 공휴일로 정했다. 설날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신정을 쇠도록 했지만 다시 구정을 설날로 할 만큼 설날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설날의 의미는 남다르다. 설날 음식중 대표적인 것은 단연 흰떡국이다. 옛날에는 떡국을 먹으려면 일 년에 한 번 설날이 돼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렇게 귀한 떡국을 이젠 설날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다.
가래떡을 뽑아 납작하게 썰어 끓인 떡국은 설날이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만큼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흰떡을 끓여 먹은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또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고하여 첨세병(添歲餠)이라 하기도 했다. 가래떡을 길게 뽑는 것은 장수 의미가 있다고 한다. 가래떡을 동그란 모양으로 썰었던 것은 옛날 화폐인 엽전처럼 생긴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에는 더욱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한다.
새해의 첫 날은 묵은 해를 정리하여 떨쳐버리고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다. 곧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혈연의 소중함도 미약해지고 있고, 모든 것이 현상적이며 형식화로 흐르고 있다. 그 기저에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목전 이득과 현상중시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한 마디로 정체성 부재에서 비롯됐다. 이번 설 연휴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쌀밥 한 그릇도 어쩌다 먹을 정도로 쌀이 귀했던 시절, 떡국을 만들어 먹는 것은 큰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런 쌀이 천대를 받는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다. 설날을 맞아 주변을 살피고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