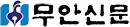어린 시절 5∼6월 날씨와 자연환경 기억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드럽고 시원한 옷들이 다양하지 않았고 조금 과장해 지금에 견주면 누더기에 가까웠던 옷들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더웠다는 기억이나 질병도 우려하지 않았다. 아마도 추억이 입혀져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덥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내가 살던 마을 앞은 중학교 입학 전까지 바다였다. 여름 방학 때면 점심을 먹고 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앞다퉈 모여 발가벗은 채 바닷물로 뛰어 들었다. 마을 어른들도 그런 우리를 보고도 위험하다고 제지하지 않았다. 그냥 즐겼고 수심이 깊은 곳은 알아서 피했다. 곧 바다는 우리들의 놀이터 였다. 갯물이 몸에 잔뜩 묻은 채 다시 옷을 입어도 끈적댔다는 기억도 없다. 지천에 널린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 쉬다보면 적은 옷까지 말라 늘 시원했다.
또 천수답 논들의 가장 위에는 방죽도 흔했다. 이곳에서 수영하다 보면 물뱀도 함께 수영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지만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논 주인들이 방죽 둑이 무너진다고 야단을 치곤했지만 그도 아량곳 하지 않았다. 이제 그분들은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분들의 나이가 됐다.
실껏 놀다가 소꼴을 베어 집에 가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한몫을 인정받았던 시절이다. 지금 아이들이 책속에 묻혀 사는 것과 서로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던 시절이었지 않나 싶다. 요즘 텔레비전에 비쳐지는 제3국의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때 우리들 모습이었다. 배만 부르면 최고였다.
밤이 두려웠던 것도 늘 또래들과 같이 있다가 혼자 남은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학창시절도 그랬다. 수업시간에 숙제를 안 해오고 떠들다 선생님께 맞아도 당연했다. 일명 사랑의 매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 치자면 그때 선생님들이 휘두른 매는 사건들이고, 사실 감정이 섞인 매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돼 실소도 나온다.
또한, 어쩌다가 기회가 주어져 아내, 자식들과 함께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갈 치면 살아 온 환경이 너무도 다르다는 느낌도 든다. 등산길 주변에 있는 열매를 따 입에 넣어 씹으려고 하면 아내는 말리고 자식들은 신기한 듯 쳐다본다. 환경이 오염됐다고들 하니 교육을 잘 받은 그들로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또한 유사시 살아가는 생존방법일진데 그들에게는 산과 들에 열리는 열매는 더 이상의 먹거리는 아니었다.
이러다 보니 무슨 과일이 언제 제철에 생산되는 지도 모른다. 돈 만 있으면 사시사철 어느 과일이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보니 ‘아버지가 병이 들어 한겨울 딸기를 먹고 싶다 하여 눈을 헤치고 딸기를 찾아 나섰던 효자 아들이 깊은 산중에서 얼어 죽어 별이 됐다’는 동화는 거짓말이 됐다.
자연의 순리대로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어야 몸도 건강할진데 아무 때나 제철 과일을 먹다 보니 지병이 많다는 것도 일리가 있을 법 하다. 따라서 신토불이, 곧 로컬푸드가 건강을 지키고 과거로 돌아가는 한 방법인 듯도 싶다.
따라서 추억은 세월속에서 미움도, 힘들었던 기억도 모두 가공되어 기억되다 보니 함께 해서 즐겁고 비밀은 혼자 간직해서 또 즐거운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어떤가. 여러 세월이 흘러 온 과정에서 그 많던 흙길들은 콘크리트로 덮이고 그 많은 나무그늘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욕심 때문에 모두 베어져 쉴 곳이 흔치 않다. 선생님은 지나친 부모들의 자식사랑에 권위가 묻혔고, 생활은 산업화로 편리해졌지만 경쟁 속에서 삶이 더 힘들다. 그래서 문득 그 시절이 그립다.
요즘 들녘 땡볕밑에서 막바지 양파·마늘 수확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시절 회고 자체가 사치이다. 그런데 세월이 한해한해 보태지면서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지쳐가는 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린 나이에는 웬만한 돌덩이 하나쯤은 거뜬히 들어 올렸지만 이제는 욕심이다. 양파망 몇 개 옮기고도 주저앉아 쉬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 말이다. 작은 돌 하나를 주어 팔매질을 해봐도 가늠거리를 가지 않는 것도 생각과 몸은 따로 간다는 느낌이다.
세월 속에서 배운 경험은 지혜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도전보다는 눈으로 가늠하고 미리 포기하는 요령으로 변질돼 변명만 느는 것도 세월이 준 몹쓸 짐덩이다.
환경이 변해가면서 정서마저 삭막해 져 간다. 좋은 글귀를 읽어도 머릿속에서 스쳐 갈 뿐 가슴에 눌러 않지를 않는다. 낮 더위에 나가려고 하니 몸이 느려지고 태만해 진다. 참 답답하도록 무더위가 싫다.
이럴 땐 만사를 제쳐 두고 산중에서 한 이틀만이라도 꼭꼭 숨어 있다가 오고 싶다는 생각이다. 농촌의 농번기를 생각하면 맞아 죽을 일이지만 말이다.
푸ㅡ른 숲과 계곡이 그리운 요즘, 청량한 바람소리를 잠시나마 느껴보고 싶어 어린 시절에 잠겨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