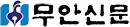그렇다고 특별한 계획이 없을지언정 종일 집안에서 시체놀이만 할 수 없어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딱히 갈 곳도 없다.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 멀리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딱히 함께 가야하는 사람 선택도 쉽지 않다. 상대방의 입장을 지나치게 이해하다 보면 지인의 선택 폭도 줄어든다. 의리나 신뢰는 젊은 나이에나 해당하는 사치라는 생각도 든다. 결국 혼자서 차를 몰고 다다른 곳은 가까운 승달산이다. 어떻게든 산에 오르면 한나절의 시간은 쉽게 보낼 수 있다.
혼자라는 생각은 산에 들어서면 금방 잊게 된다. 매월 한 두번 오르는 산이지만 요즘 같은 늦가을에는 여태 보지 못한 자연의 단면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늘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있었던 나무와 바위들이 눈길을 주면 새롭게 태어난다.
요즘 늦가을 정취는 하루가 멀게 나뭇잎이 산행길을 덮고 있다. 등산로 곁길에는 벌레먹은 참나무 잎들이 노란 빛을 띤 채 그 동안 자신을 지탱해 준 생명줄 나무와 이별 준비를 하듯 바람결에 재잘거림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여름날 온통 푸른빛에 녹아들어 존재감도 없었다. 그리고 이 늦가을이 되어서야 그들만의 색깔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산은 여러 수종이 모여 숲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찍 져버린 활엽수림 사이로 붉게 물든 홍단풍은 눈을 호강시켜주기도 한다. 가을의 제 맛은 역시 각양각색의 단풍이다. 갈무리하는 화려한 꽃도 보인다. 그 속에는 열매가 여물고 있어 지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함을 알려 준다.
흔히 우리는 귀한 것을 곁에 두고도 방치하고 산다. 귀한 것을 가졌음에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귀하고 나만 소유한 것도 시간 속에서 그 가치는 삭아진다. 매일 보면 그 진가가 덜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 경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강과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과 다소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가끔 봐야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것을 세월이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도 매일 똑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다보면 가치를 모른다는 것.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대로 살지 않고 살아 온 방식대로 묻어 살면서 추억을 포장해 살아가다 보니 변화를 읽지 못하는 독선이 주관이 되곤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주말 여수 금어도 비렁길을 아내와 함께 다녀 왔다. ‘비렁’은 여수 사투리로 언덕을 뜻한다고 했다. 철선을 타고 20여분 만에 도착한 그 곳은 아직 산업화 때가 조금은 덜 묻어 있었다. 철선을 타고 가면서는 바닷물 속에서도 우뚝 솟아 있은 바위섬도 보았다. 그 많은 인고의 세월을 깊은 물속에 뿌리 내리고 속살을 모두 깎인 채 버티고 있는 모습, 그 곳에는 영양분 조차 없을 것 같지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몇 그루의 나무는 바위섬의 존재감을 더해 줘 절로 탄성이 나온다.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몰려 온 사람들은 면식이 없는데도 좁은 비렁길에서 스스로 양보하는 것도 산행의 미덕이다. 결국 그곳에서 일기예보에 없는 비를 맞았고, 이후 감기 몸살로 3∼4일은 후유증을 앓았다. 그때서야 무관심하게 달고 다녔던 몸뚱아리의 소중함에 건강을 약속하지만 또 지금은 잊어버렸다. 편할 때는 나를 지탱해 주는 주변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비렁길 같은 길들은 내 어린 시절 늘 걸었던 길이었다. 눈만 뻗치면 볼수 있는 바다가 있었고, 땔감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 보면 이만한 풍경은 족히 됐었다. 그런 아름다움을 당시에는 모른 채 살아왔고 이제는 산업화로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은 추억에서만 살아 있다.
가치 있는 것도 내 주변에 두고 멀리서만 찾다보니 아름다운 경관은 늘 멀리 있게 마련이다. “멀리서 본 영웅은 있어도 가까이서 본 영웅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늘 멀리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인품이 좋고 능력 있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절대 큰 그릇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와 별반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와 어울림속에 동화되어 있다보니 평범하게 보일 뿐이다. 매스컴 속의 스타도 내 곁에 있으면 평범할 뿐이다.
가을이 깊어간다. 황금빛 들녘은 추수가 끝나 텅빈 겨울의 황량함을 미리 보여 준다. 가을빛을 가득담은 고목에 달린 감이 빨갛게 익어 주렁주렁 하다. 이도 이제는 볼거리로 전락했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뒷마당에 한 그루씩 있어 배고픔을 달래주던 감나무 였지만 찾아보기가 드물어 졌다. 그리고 텃밭에는 단감과 대봉이 가지가 휘도록 열어 토종 감나무 대신 먹거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가을 주말에도 바스락 대는 낙엽을 밟으러 가까운 산을 찾아 가고 싶다. 그런데 난데없이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한중 FTA체결 소식에 이 가을의 농촌 정취가 내년에는 이만 못할 지도 모르겠다. 승달산을 내려오는 단풍나무길이 아름답다. 곁에는 산갈대가 허연 백발을 휘날리며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는데 FTA 타결로 위축된 농민들의 모습과 클로즈업 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