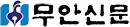임재택 논설위원(목포 문태고 교장)

역설적이게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애도 성명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로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캄캄한 고독 속에 남겼을 172자의 유언을 멍하니 읽고 또 읽어본다. 어찌 보면 싯구절을 연상케 하는 14줄의 짧은 단문이지만 결코 짧다할 수 없는 길고 긴 여운이 단어들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조각”이라 표현했지만 그 누가 어찌 죽음을 선택한 그의 고통과 번민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의 곧은 신념은 현실을 모르는 아집으로 지탄받았으며 그의 솔직함이 어느 땐 가벼움으로 비판받았고, 독단적 권의주의를 배격하다 정작 대통령의 권위와 체면도 지키지 못한다는 질타마저 들어야 했다. 돌이켜보건데 바보 노무현을 지탱해 온 것은 솔직함과 더불어 자존심이었다.
그러했기에 도덕성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상황들 앞에서 어쩌면 그는 또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선택할 수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유서에서는 고통과 번민, 자괴감과 슬픔마저 억누르며 고마움으로 시작했다.“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표현으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죄책감과“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는 그의 진한 번민,“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는 자괴감은“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는 그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상실을 읽을 수 있다.
스스로를 상실해버린 노전 대통령은 많은 세월동안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너무 슬퍼하지 마라”고,“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미안해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라”
떨리는 손으로 마음을 다잡았던 생각들, 지인들을 향해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유언 말미에 가족들에게 화장을 부탁함에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진 고통의 육신을 태워서라도 자유를 찾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 달라”는 부탁은 그래도 고향에서 가족과 함게 하고픈 한 인간으로서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돌이켜보건데 안타깝기로는 산행에 동행했던 경호원이 밀착 경호와 실종직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바보로 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언에서처럼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면서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그의 죽음은 현실을 사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그래서 바보 노문현을 사랑했던 사람들만의 슬픔으로 남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이처럼 가슴아파하면서 바보이자 고집스러운 노무현을 애도하는지 모른다.
산자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우리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밀짚모자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모습, 길가에 앉아 봉하마을 주민들과 막걸리 한잔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던 서민 대통령 노무현. 그의 뒷모습과 그 뒤를 따르던 그림자가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원망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메시지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의 명복을 빈다.